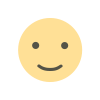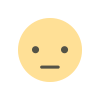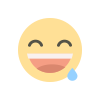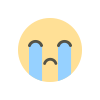옹달샘

 류윤모 논설실장
류윤모 논설실장
요즘은 시골 어딜 가나 집집마다 수도를 틀면 물이 좔좔좔 쏟아져 나오지만, 옛날에는 물을 길러
아낙네들이 빈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옹달샘으로 갔다.
옹달샘의 수호신처럼 오래 묵은 향나무가 있었고 샘물이 흘러넘쳐 내려가는 곳에는 샘터라는 반
반한 이마 같은 빨랫돌이 놓여 있는 장소가 있었다.
아낙들은 빨래를 이고 와서 땟물이 다 빠져 나갈 때까지 방망이로 두들겨 빨래를 했다. 빨래하며
수다도 떨고 같이 뉘 집 아낙의 흉도 보는 장소가 샘터였다.
어젯밤에는… 하며 볼 장 다 본 아낙들이 농도 짙은 음담을 주고받으며 깔깔거리곤 했다.
신혼의 새댁이 샘터에 물이라도 길러오는 기척이면 대놓고 직설적인 음담을 던져 안 그래도 부끄
럼타는 새댁의 얼굴이 발그레 홍조로 물이 들곤 하는 것이었다.
어쩌다 골목길에서 눈이라도 마주칠라치면 눈을 빨며 볼을 붉히는 새댁은 물동이를 이고는 엉덩
이를 실룩거리며 종종걸음으로 지나치곤 했다.
가슴이 뻐근해 오던 그런 부끄럼이 다 어디로 가버렸나 이제 볼을 붉히는 부끄럼을 홍조라는 질
환으로 다스린다고 한다. 편리하게도 병원에 가면 부끄럼도 치료해 주는 세상이다. 아니면 파운
데이션으로 떡칠을 해버렸으니 홍조가 나타날 턱이 없다.
그러니 수치심이 남아 있을 턱도 없다. 가려진 은근한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도발의 강도는 더 쎄
게의 첨단을 달리고 있다.
은근한 아름다움은 눈 닦고 봐도 없다. TV 브라운관에서 막 빠져나온 듯한 동일 성형외과 출신의
닮은꼴 인형들이 온통 거리를 메우고 있다.
다들 아래턱을 깎아 반쪽으로 만든 얼굴, 왕방울 같은 눈, 오뚝한 콧날, 얄팍한 입술~ 한점의 체
온도 느껴지지 않는 마네킹들.
기성세대가 촌스러운 건가. 요즈음 미의 기존이 아무래도 적응이 잘 안 된다. 숙성한 처녀의 부
끄럼타던 복숭아빛 은은히 물들던 볼, 치마 속에 가려져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던 둔부, 언제부
턴가 이런 은근한 아름다움이 사라져 버렸다.
양파 껍질처럼 다 벗겨놓았으니 더 벗길 것도 뭣도 없는 수위 높은 도발 앞에 도리어 숫기없는
남성들이 눈 둘 곳이 없어 쩔쩔매는 세상이다.
- 류윤모 논설실장-
저작권자 ⓒ 뉴스울산(nunnews.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뉴스울산
뉴스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