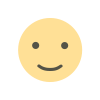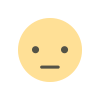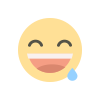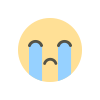마음에 빈 방 한 칸 들여놓고
번잡한 세속을 등지고 찾아간 사찰에서의 일박은 각별하다.

도심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소음공해에 귀가 시들고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피를 잡지 못한다. 자고나면 도로위에서의 속도 경쟁, 널리고 널린 유해한 먹거리들. 아귀다툼들.
마천루같은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치솟는 신도시들의 베드타운에서 잠만 자고 일에 매몰된 삶. 마음이 한자리에 붙박일 수 없어 주말이면 교외로 교외로 승용차들의 물결을 이룬다.
하지만 어디에 뿌리내리건 붙박이 삶을 사는 민들레같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잡을 수 없는 것이 도시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식물은 제자리에 붙박인 뿌리의 삶을 영위해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쁘거늘 사람은 집을 수도 없이 옮기고 바꾸면서도 진정한 기쁨을 찾는 이가 드물다.‘
무슨 이유에서 일까. 부초처럼 떠도는 도시인들. 살아오면서 수많은 방을 만났지만 아늑하고 조촐하며 전 존재의 행복감을 구가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고적한 산사에서의 일박. 현란한 가구 일체를 생략해버린 여백이 있는 정처. 비워낸 방에서의 일박은 마치 단식을 끝낸 몸에게 맨 처음 먹여주는 미음 같은 것.
산사에서 내주는 방은 조촐하다. 가구와 가전 일체가 없다. 절은 ‘맨밥’같은 방 한 칸을 내준다. 사면 벽으로 이루어진 공간. 뭔가 적응이 안돼 맥없이 스마트 폰을 들여다보다가는 내가 이럴려고 왔나 싶어 꺼둔다. 시계를 들여다보다가 뭐 어차피 누구 만날 일도 할 일도 없는 터에 시간은 알아서 뭘 하겠나 싶어 손목에서 끌러 윗목에 가지런히 둔다.
모든 문명의 이기를 멀리하고 ‘나’ 중심으로 돌아와 상념에 잠긴다.
온갖 상념이 잡상념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 또한 부질없는 짓이다 싶어 누웠다 앉았다. 뒷짐을 지고 방안을 서성거리기도 한다. 속말이 있으나 더불어 말할 사람이 없다. 두고 온 사람 생각이 왜 없겠는가. 접어놓고 온 일에 왜 불안하지 않겠는가. 일을 잊자고 온 곳에서도 일은 끝나지 않는다고 잊고자 하여도 잊기 어려운 것은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둔다..
삶에서 한발짝 물러나 내 안을 골똘히 들여다 본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욕망했던 일들. 그 실체를 해체해 본다. 그게 정녕 그토록 집착할 일인가.
무위 자연 이라고 하릴없이 한 일이 없어도 때는 찾아온다.
자극적인 양념을 배제한 소찬의 공양으로 點心, 마음에 점을 찍는다. 산나물과 말간 국으로 차린 소찬의 밥상도 나쁘지 않다. 빈 절간에서 맞는 밤은 적요하다. 더 캄캄하다. 밤이 이렇게 어둡고 요요로웠나 싶다. 밤이 이렇게 길었다니, 잠을 자고 나도 한 밤중이다. 일어나 긴 밤을 휘적휘적 걸어도 좋다.
여기까지 와서 구겨진 잠을 잘 필요는 없을 테니. 절 마당에 조용히 솟은 탑돌이를 해본다. 한두 가지 소원을 빌면서, 인적없는 절 마당에 쪼그려 앉아도 좋을 터. 휘둥그런 달밤을, 댓가지가 치는 조요로운 묵죽 한 폭을 고스란히 심상에 아로새기며 ... 소란스런 세상에 휩쓸려 천상천하 유아독존, 소중한 나의 생이 왜 도매금으로 불행감 쪽으로 동승해 있는지 ., 지금 나를 흔들고 있는 것의 실체를 스스로에게 자문해보라 .
눈만 뜨면 이기고 지는 것에 목숨 거는 그 속세의 소란이 내게 정녕 미래의 행복을 담보해 줄 것인지를. 멀리 떠나와 보고 싶은 그리운 얼굴, 이곳에 빈 방이 있다는 것, 비로소 마음에 빈방 한 칸 들여놓았다는 사실을 머잖아 깨닫게 될 것이다.
글/류윤모 논설실장
저작권자 ⓒ 뉴스울산(nunnews.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뉴스울산
뉴스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