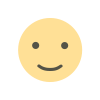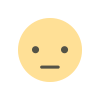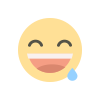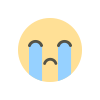나의 10대, 그리고 가출
▲ 류윤모/논설실장 ⓒ 뉴스울산/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어렴풋하다. 10대 후반 출가가 아닌 가출을 하여 강원도 일원을 떠돌고 있었다. 당시 왜 도시로 눈길이 쏠릴 산골 소년이 도시가 아닌 강원도까지 생뚱맞게 올라갔을까. 지금 생각하면 나도 당시의 내 마음을 알 길이 없다.
부글거리는 浮氣 때문이 아니었을까. 알 수 없는 반항심으로 국토의 최북단까지 거침없이 치고 올라가고픈, 낡은 배낭을 메고 시외버스에서 내려 먼지 푸석이는 신작로 길을 벗어나 연고라고는 있을 턱이 없는 후미진 산촌을 터벅터벅 걷다가 농번기, 농사일을 하는 촌부가 있으면 일부러 말을 붙여서 일을 거들어주고 감자와 옥수수를 짓이겨 내오는 감자밥을 얻어먹고는 걷고 또 걸었다. 마치 부글거리는 나 자신의 육체에 화풀이라도 하듯.
해거름에 사위四圍는 어둑어둑해지고 갈 곳도 , 오라는 곳도 없는 길손인 나는 산모퉁이를 돌아 무섬증에 마을로 들어섰는데 나지막한 집들이 드문드문 산자락 아래 조갑지처럼 붙어 있었다. 특별할 것이 없는 강릉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마을, 병풍 같은 산자락에 둘러싸여 마을은 늦게 해가 뜨고 일찍 해가 떨어지곤 했다. 9월인데도 으스스 한기가 옷깃 속으로 파고 들었다.
나는 집이 드문드문 독가촌으로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의 산그늘 아래서 두어 방울 눈물을 버렸다. 해가 지는 광경을 마을 어귀의 한 느티나무 그늘아래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어두워지면 잠잘 곳마저 없을 것 같아 발길을 마을로 떼 놓았다.
역시 강원도는 낯선 젊은이를 한뎃잠에 들게 할 정도로 인심이 야박하진 않았다. 서까래가 훤히 드러나는 방이었지만~ 즈므마을, 지금도 즈므라는 지명이 지금도 생각하면 사람이 없고 내일이 없는 저무는 황량한 들녘의 상징처럼 떠오르곤 한다 .
요즘도 나는 네온사인 화려한 도시보다는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조금은 외진 즈므 같은 곳에서 안정적인 위안을 받아오곤 한다.
즈므, 라는 지명을 입속말로 되뇌다 보면 지금도 산그늘이 다정하게 다가서는 것 같고 말없이 그 산그늘의 품에 파묻히는 나 자신의 모습 또한 다분히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
곰곰 생각해보면 낯설고 물 선 그 마을을 찾아들었을 때 볼 붉은 소년의 어리다면 어린 나이의 나는 그 쓸쓸한 공간에서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았던 것 같다.
즈므마을, 불현듯 한 번쯤 그 마을을 다시 찾고 싶을 때가 있다. 시인 노발리스는 ‘마음이 외부의 현실적이며 개별적인 모든 대상에서 놓여나서 스스로를 느낄 때 이상적인 본연의 마음의 자리가 찾아온다.’고 했다.
앞뒤 생각없이 훌쩍 떠나는 여행은 멀리 떠나 나를, 내 안을 직시하는 여정이다. 지금 길을 잃고 갈등에 휩싸여 있는 그대 멀리 떠나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돌아볼 일이다.
글/류윤모/논설실장
저작권자 ⓒ 뉴스울산(nunnews.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뉴스울산
뉴스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