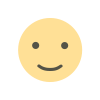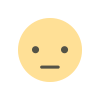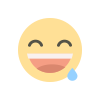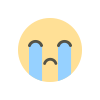간이역을 찾아서
푸른 불 시그널이 꿈처럼 어리는
거기 조그마한 역이 있다
빈 대합실에는
의지할 의자 하나 없고
이따금
급행열차가 어지럽게 경적을 울리며
지나간다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아득한선로 위에
없는 듯 있는 듯
거기 조그마한 역처럼 내가 있다
한성기, 역
모름지기 겨울여행의 백미 중 백미는 정보화, 현대화의 물결에 떠밀려 역사의 행간 뒤로 사라져
가는 간이역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홀로 떠나는 길손의 여정은 눈썹도 빼놓고 간다는 말처럼 간
결하게, 입은 옷 그대로 일단 나서고 보는 것. 주위의 풍경과 제대로 동화될 낡고 우중충한 회색
빛 옷차림이 제격이다.
어느 간이역 역사 앞에 서서 당도할 승객을 초조하게 기다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겨울바람에 한
줄기 바람이 되어 펄럭인다면 길손의 쓸쓸한 심사를 한껏 반영하게 될 것이 아니랴.
겨울여행은 주변의 풍광을 눈에 담기 위함이 아니라 흑백사진 같은 지나온 세월을 반추하며 타임
머신을 타고 과거로 거슬러 오르는 시간여행.
작은 역사의 대합실에 낡은 나무 의자가 놓여 있고 중앙의 톱밥 난로를 둘러싸고 몇몇의 손님들
이 기침을 쿨럭이며 당도할 기차 시간을 기다리는 풍경을 기억 속에서 가까스로 불러낸다.
느릿느릿한 시골 사투리의 늙수그레한 아낙들이 들고 이고 기차에 오를 보따리에 든 갖가지 농산
물들의 이마 맞댄 정겨움에 시나브로 눈시울이 젖어든다면 그도 분명 흙의 아들이리라.
응답하라 1988 세대처럼 지나온 과거를 느릿느릿 파노라마처럼 불러내 본다. 그 시절 그때를 가까
스로 지키며 버티고 서 있는 낡아가는 간이역, 낡은 이발소 간판, 무슨무슨 집이니 주점간판들이
형편없이 찌그러지고 삭아서 낡아갈......,
생각나는 대로 희방사역, 석불역, 심천역, 화랑대역이니 이 땅에서 존재했던 것들이지만 머지않
아 기억 속으로 사라져갈 아름다운 이름들을 하나하나 호명해본다.
하늘도 세평, 땅도 세평, 꽃밭도 세평이라는 승부역. 한 사람의 역무원도 없는, 역장 혼자서 외로
이 깃발을 흔들 승부역까지 목적 지향도 없이 거슬러 올라가 보고 싶다.
덜커덩 덜커덩 느린 기차의 분절음에 기대어 졸다가 깨다가를 반복하며 ‘계란이 왔어요, 땅콩이,
오징어가 맥주가 …….” 잠을 횡단해가는 홍익회 회원의 수레바퀴소리, 이젠 어디에서도 찾아볼
길 없어진 그 7080 정서를 떠올려본다.
정보화 물결에 떠밀려 역사의 행간 뒤로 모습을 감추는 것이 어디 간이역뿐이랴. 유인등대, 시계
포, 도장가게, 양복점, 다방……. 이제 머뭄과 가고 오는 사람과 추억에 얽힌 군집의 장소 대신 효
율, 편리만이 남아 체온 한 점 붙지 않은 쇠붙이들의 무정한 속도로 오갈 뿐이다.
시원섭섭, 세월의 변화는 이렇듯 감당 못 할 정도로 빠른데 우리는 아직도 뇌가 굳어버려 분리적
2분법 사고에서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 것이다.
시인 정현종은 ‘견딜 수 없네/ 내 마음 더 여리어져/ 가는 팔월을 견딜 수 없네/ 9월도 10월도… 흘
러가는 것들을/ 견딜 수 없네./ 사람의 일들/ 변화와 아픔들을… 있다가 /없는 것. 보이다가 /안 보
이는 것 / 견딜 수 없네’라고 울먹였다.
하지만, 우리는 견뎌내야 한다. 상투 틀고 갓 쓴 선대들이 결국은 도도한 개화의 물결을 막아 설
수 없던 것처럼. 거부할 수 없는 가공할 속도의 흐름을 도저한 인간의 힘으로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이 다시는 역행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산더미 같은 물결의 변화의 바람이 분다. 나의 정신세계는 지금 한 점의 간이역처럼 시간의 눈동
자 안에 외로이 서 있다.
류윤모(시인)
저작권자 ⓒ 뉴스울산(nunnews.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뉴스울산
뉴스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