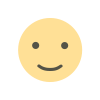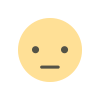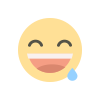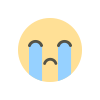가자미 조림과 부부
▲ 류운모 논설실장 ⓒ 뉴스울산
봄은 정자나 주전 바다의 가자미 말리는 풍경에서부터 온다 .
꼬들꼬들 말라가는 가자미를 펼쳐놓은 눈 앞의 정경을 보면 마음이 따스해진다. 집채 만 한 파도가 어린 파도를 데리고 달려왔다
달려가는 모습이 마치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며 까르르 웃는 여인의 흰 레이스 달린 치맛자락을 닮았다.
降雨 / 김춘수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지미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 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괴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뼘 두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시를 읽다보면 비속에 가자미 조리는 맵싸한 냄새라도 확 풍겨올 듯하다. 고추장으로 맵싸하게 조린 가자미(넙치) 구이는 밥도둑. 가자미는 조려서도 먹고 구이로도 회 로도 이 봄철의 놓았던 식욕을 당겨온다 . 촉촉한 봄비 적시는 날 가자미 구이가 놓인 따끈한 밥상을 받게 되면 이 시가 불현 듯 떠오르곤 한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먼저 떠난 부인을 그리는 시인의 마음이 이 시에 절절하게 묻어있다 . 상처하고 혼자 사는 노시인의 외로움이 눈앞에 펼쳐 질 듯도 하다
늘 곁에 있던 사람이 떠난 자리의 공허감을 견뎌내기 힘드셨을 것이다 . 더욱이 80 고령이니 몇 년이 흘렀건만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체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터. 늘 곁에 있던 그 모습, 다정하던 그 목소리, 수십 년 맡던 그 체취...
부부는 이처럼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 한 마음 한 몸으로 육화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리지가 되어 있었던 것. 그 사람이 떠나봐야 떠난 자리를 새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처럼. 사람 든 자리는 표가 안 나도 사람 난 자리는 금세 표가 난다는 말처럼 어느 날 천둥치듯 벼락 치듯 두 사람을 갈라놓은 사별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이승을 떠난 아내가 어디 이웃에라도 잠시 다니러 간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왜 없었을 것인가. 그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리고 금방이라도 아내가 돌아올 것만 같은 착각 속에 살아냈을 시인의 한없이 고독했을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한번 가면 일자무소식의 , 저승길 홀연히 떠난 사람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시를 읽는 이에게도 그대로 전이되어 연민을 자아내게 한다 .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라고 엉뚱한 질문을 하며 서성였을 노 시인의 모습에 느닷없이 그 허허로웠을 마음이 삼투되어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괴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뼘 두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아내가 잠시 누워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부질없이 방문도 열어보고 어쩌면 평소에도 늘 도지곤 하던 지병이 다시 도졌는지 모르겠다고 스스로를 위로해 보기도 해 보는 것이다. 어디 다니러 갈 때면 늘상 해오던 대로 맵싸한 넙치 조림의 밥상 정성스레 차려 놓고 어디 갔는지 아내는 돌아오지 않고 예나 다름없이 아내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하는 시인은 방안을 서성이고 .......날은 어두워 오건만 이 사람이 돌아오다 무슨 큰 변이라도 당했나 안절부절하며 기다리는 시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창밖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
결국 현실로 돌아와 아내가 먼 세상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내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체념하고 냉정한 현실로 돌아오니 무릎에 힘이 빠진다. 결국 홀로 댕그라니 남은 노시인은 어린아이처럼 소심해진다 . 아내지만 때론 친구 같기도, 엄마 같기도 했을 1인 3역의 아내를 이제 어디서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아뜩해진다 .
혹시나 하고 /밖을 기웃거려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글/류윤모 논설실장
저작권자 ⓒ 뉴스울산(nunnews.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뉴스울산
뉴스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