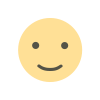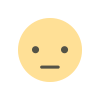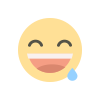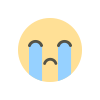(27-1)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백봉령 - 삽답령(1) 17.0km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던가.
산은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었다. 마냥 부드럽게만 보이던 눈도 몇 십 년 만에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쏟아지듯 내렸으니 말 그대로 폭설(暴雪)이 되었다. 밤새도록 걱정을 앞세우고 도착한 백봉령(白鳳嶺)은 제설장비로 깎아 내린 적설 상태가 어깨 높이까지 올라왔다. 이쯤 되면 눈조차 폭력이 된다. 백봉령은 눈에 갇히고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무슨 일이 되었던 여백이 없는 충만은 지금처럼 폭력이 되기 싶다.
‘온 산에는 새 들도 날지 않고 (天山鳥飛絶) 길이란 길에는 사람의 발길도 끊어 졌구나 (萬經人踪滅)...’ (유종원의 강설(降雪) 부분)
눈은 밤새도록 산에 남은 흔적을 모두 지웠다.
흔적이 사라지고 온산이 눈에 덮이니 산은 길을 잃었다. 산은 산이 아니요, 길을 잃었으니, 길 또한 길이 아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 고요만 가득 할뿐이다.
우리도 길을 잃었다. 길을 앞에 놓고 찾을 수가 없으니 돌아가야 하는가.
길을 잃은 것은 사람일인데 당송8대가로 칭송을 받던 시인은 하늘을 나는 새들도 길을 잃었다고 노래했다. ‘새들도 날기를 멈추었고.....’
한 때 유람하기는 좋으나 오래 살 곳은 못된다(可一時遊賞非久居處也).
대관령 북쪽은 오대산이요, 그 맥이 남쪽으로 백봉(白鳳)을 지나 두타산에 이르렀고...(大關嶺之南歷溪白鳳兩嶺爲頭陀山).
택리지는 강릉 남쪽에서 두타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에 백봉령이 있음을 얘기했다.
고갯마루 동쪽은 고갤 넘어서면 곧바로 동해 삼척바다이다. 백봉령은 삼척에서 해산물과 소금을 지고 넘던 고갯마루다. 특히 남한강을 따라 실려 온 소금은 단양까지만 운송되었고, 정선부터는 삼척이나 강릉에서 생산된 소금이 백봉령을 넘어 왔으니, 백봉령은 소금고개가 되었다.
그 당시 소금 값은 쌀값과 비슷했다. 쌀 1석과 소금1석을 맞바꿀 정도였으니 백봉령은 그것만으로도 매우 값비싼 노릇을 해낸 고개로 이름을 얻기도 했다.
문헌에 따라 백복령(百福嶺), 백복령(百複嶺) 희복현(希福峴)으로 불렸지만 1900년대 초까지도 왕래가 잦았고, 아직도 한양으로 가는 옛길 표지가 고갯마루 아래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집 서방님.../ 노가지 나무 지게 위에 엽전 석 냥 걸머지고 / 강릉 삼척 소금 사러 가셨는데 / 백봉령 굽이굽이 부디 잘 다녀오소.’/
정선아리랑도 백봉령 구비마다 서린 백성들의 애환을 노래했다.
백봉령에 서면 대간 산행꾼들이나 환경론자들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입에 올리는 것이 자병산(紫屛山) 모습이다. 70년대 초반부터 석회석 채취를 위해 산을 파헤치기 시작했던 것인데...이제 그 정도가 지나쳐 산봉우리 자체가 없어지고 있었다.
오늘은 폭설에 묻히니 그나마 파헤친 모습을 감춰주고 있다.
소설가 박완서는 그의 기행산문집 ‘잃어버린 여행가방’에서 에티오피아 난민촌 참상을 목격한 후 ‘어떤 대상을 본다는 것은 곧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단지 그 실상을 보았다는 것 하나로도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는 소회를 얘기했었다.
백봉령에서 바라본 자병산의 모습도 그와 같다.
내 일이 아니라고 고갤 외면 할지 모르지만, 보았다는 것 하나로도 그 책임감이 느껴진다. 자병산 모습은 참혹했다.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것처럼 가슴이 먹먹해진다. 마치 전쟁 중 집중포화를 맞은 봉우리처럼 산은 조금씩 그 흔적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나무한그루, 풀 한포기 없는 민둥산이 되고 말았다. 불쌍한 모습이다.
석회석의 개발은 산업화가 시작된 80년대 초 부터 시작되었다하니, 벌써 30여 년 이상 파헤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자병산은 지도상에서 영원히 지워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를 두고 19세기 프랑스 낭만파작가였던 샤토브리앙은 ‘문명 앞에 숲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남는다 했던가,’ 맞는 말이다. 한 때는 울창했던 산림이 이젠 나무는커녕 그 형태조차 사라지고 없다.
모두 인간들의 그릇된 욕심 탓이다.
자병산이 사라졌으니 이제 갈 수가 없다. ‘자줏빛 병풍산’ 아마 이름그대로 아름다웠으리라.
‘사람들이여, 이제 자병산을 불쌍하게 보지 말고 가엽게 생각해주오’.
변변한 자원하나 없는 가난한 이 땅을 위해 자병산은 소신공양(燒身供養)을 한 산이다.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길도, 몸을 쉴 수 있는 집도, 공장들도, 학교도 어찌 보면 자병산이 자기 몸을 조금씩 떼어내 준 덕이다.
자병산은 자신을 살라 저렇게 험한 모습이 되었으니 위로라도 해줘야 한다.
산행 초입부터 폭설은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다행이도 서너 사람이 러셀(Russel) 한 흔적이 남아있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보았다. 그러나 단 한발자국만이라도 벗어나면 무릎까지 빠지는 적설량이다. 철탑을 돌아서서 간신히 산 하나를 넘어서니 앞서가던 발자국마저 사라지고 없다.
선두대원은 사방을 둘러보아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는지, 손사래를 치면서 돌아 나온다. 앞 팀도 필경 산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모양이다.
우리가 그 길을 헤쳐 나가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적설량은 상상을 초월했고 발붙일 곳조차 없다. 어찌 할 것인가. 겨울 산에선 요행을 바래거나 설마는 기대서는 안 된다. 포기는 분명하고 빠를수록 좋은 것이 겨울 산행이다.
경험상 적설량이 무릎을 넘어서면 정상적인 산행은 힘들어진다.
최초로 동계 태백산맥 단독 종주(그 때 만해도 ‘백두대간 종주’라는 말 대신 ‘태백산맥종주’라는 말이 대중화 되었을 때다)를 마친 여성 산악인 남난희의 산행기, ‘하얀 능선에 서면’에 나오는 점봉산 구간도 이와 비슷했을까.
그녀는 산행기 끝부분에 새벽 6시30분 출발, 저녁 6시까지 죽을힘을 다해 죽인 거리가 6km의 절반인 3km임을 기록하고 있다.
적설산행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종일 걸어 간 산행거리를 ‘죽인거리’라고 표현 할 만큼 사투를 벌인 산행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산에서 막영을 했지만, 지금 우리에겐 그럴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산은 돌아가라 호통을 친다.
다시 울산까지 돌아갈 길이 천 리 길, 그리고 내일 아침은 일찍 출근을 해야 하는 이 땅의 샐러리맨들이다.
온 산의 길은 눈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비어있지 않으면 그릇이 아니듯, 소통할 수 없는 길 또한 길이 아니다.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린 셈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길을 잃으니, 온 산은 모두 길이 된다. 적설(積雪)은 분별을 없앤다. 분별이 없으니 미추(美醜)도 하나요, 굴곡을 채워주니 산도 길이 되고, 길 또한 산이 된다.
그 분별하나만 없어도 지금보다 훨씬 살만한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겨울산은 빈부와 귀천이 따로 있지 않고, 공존하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곳이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눈 쌓인 겨울 산을 좋아하는가 보다.
눈은 그렇게 쉽게 덮고 지워준다. 쉽게 덮어 주는 만큼 분별도 쉽게 한다. 분별이 쉽다는 것은 행, 불행의 판단도 아주 쉽게 해준다는 말이 된다. 복잡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비 보다 눈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눈 덮인 산은 침묵의 또 다른 형태다. 몸서리 쳐지는 침묵이 아닌, 깊고 낮게 가라앉은 침묵이다. 겨울산은 그렇게 지그시 눌러주는 무게감이 있어 좋다
잠시 눈길에 둘러 앉아 쉬기로 하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당연히 산행을 놓고 얘기가 오갈 줄 알았는데, 웬걸 술 좋아하는 대원이 배낭에서 술부터 먼저 꺼낸다. 물론 술이 해답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묘책이 있어보이지도 않는다. 답답하니 우선 쉽게 소주 생각이 났으리라. 그것도 산행하면서 생긴 버릇이다.
오늘 산을 걸은 시간은 고작 1시간도 못된다. 아니 30여분 정도, 나머지는 길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산 아랫길로, 흔적이 간신히 보이는 양달길로, 아니면 그냥 편한대로 큰길 변두리로 돌아다니며 한마디로 서성거렸다.
학교 다닐 때 제대로 된 공부는 시작도 못하고 준비한답시고 책만 뒤적이다 보내버린 시간처럼 그렇게 서성이다 처음 출발장소로 그냥 돌아 온 셈이다. 시간은 기다리지 않는데도 말이다.
‘서성댄다’ 함은 머뭇거림으로 보낸 쓸모없는 행위를 얘기함이니, 어찌 보면 삶은 부딪치며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그 주위에서 서성거림이 더 많았던 것이 이제까지 살아 온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산행에서 서성거림은 아무 대책 없는 소비인가. 아니면 그냥 흔적조차 없어지는 시간들인가. 지금 돌아갈 길이 천리인 것을 생각하면 슬그머니 부아가 치민다. 술이 익을 때처럼 부글부글...속에서 천불이 난다.
그리고 몇 잔의 술을 나눠 마셨지만 가슴이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다. 누군가 그만 일어서자고 한다. 일어나면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모두들 그 말뜻을 알아차린 듯 엉덩이에 묻어있는 눈을 털어내며, 금번 산행에 대한 기억을 지워내는 것으로 산행을 마감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살면서 욕심은 언제나 화를 부른다.
때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도 용기 있는 일이다.
그것은 아직 갈 수 있는 길이 남아있다는 것은, 길을 떠난 자에 있어 그나마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 08. 2. 21)
저작권자 ⓒ 뉴스울산(nunnews.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뉴스울산
뉴스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