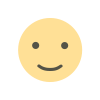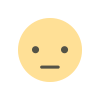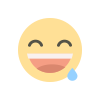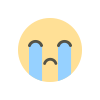15 ,종숙이는 날 산으로 보지 않고

종숙이는 날 산으로 보지 않고
(버리미기재 - 지름티재 11.1km)
속담에 ‘어정칠월 동동팔월’이라 했다.
칠월은 삼복더위로 날씨도 덥고 하니 농사일도 쉬엄쉬엄하고, 팔월은 입추가 지나면, 곧 추수철이 돌아오니 부지런을 떨어야 된다고 얘기했다.
인디언들도 7월은 ‘열매가 빛을 저장하는 달’이라 했다. 열매가 빛을 저장한다는 함은 성장을 멈추고 익어 가니, 곧 쉬어간다는 뜻이리라.
식물도 한 여름더위 때는 생장조차 멈추었고, 일꾼들도 칠월 백중을 ‘머슴날’이라 하여 호미를 씻고 천렵을 즐겼으며, 하안거(夏安居)에 들어갔던 스님들도 해제일을 맞아 치열했던 정진을 끝내고 산문 밖으로 운수행각을 떠나는 계절이다.
울창한 숲도 우리에게 짙은 그늘을 내어주며 쉬어가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같이 ‘염소뿔도 녹인다’는 폭염에선 대간 길도 쉬는 것이 마땅하다. 밤이 깊어지니 어둠속으로 비까지 내린다.
비가 내리면 철새들은 길 떠나길 미루었고. 풀벌레도 울음을 멈추었다. 심지어 비를 피해 추녀 밑으로 모인 짐승들끼리는 서로 잡아먹는 행위조차 삼간다 했다. 또 떠나야 하는가, 소리 없이 밤비는 또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것이 본래 여름 산행의 풍경이다.
광해군 때 허균의 절친한 친구이자 쌍벽을 이뤘던 조선조 최고 시인 권필은 이렇게 비가 내리는 밤엔 오랜 된 친구와 잔(盞)잡아 담소를 즐겼으니 야우잡영(夜雨雜詠)이라, 은근히 술 생각도 난다. 그러나 새벽이면 다시 길을 떠나야 한다. 비까지 내린다니 왠지 모를 비장감마저 일어난다.
비가 내린다는 것은 산행에선 혹서보다 훨씬 힘든 법인데... 우중산행(雨中山行)은 자칫 짜증부터 나기 쉽다. 그러나 산에서 만난 고난은 나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곤 한다. 그런 걱정으로 뒤척이길 몇 번, 거의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것이나 다름없다. 깨어나니 몸은 이미 비에 흠씬 젖은 듯, 온 몸이 무거웠다.
장성봉(915m) 아래 버리미기재에 도착하니 날씨가 화창하게 개었다.
금번 구간은 희양산 아래 은티마을까지 11km, 장성봉에 오르니 멀리 희양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산머리에 있는 하얀 바위가 멀리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신비로운 산, 희양산이다.
그냥 희양산을 가고자 한다면 이곳에서 곧바로 애기암봉을 타고 봉암사 안쪽 계곡인 봉암용곡(鳳巖龍谷)으로 내려가면 희양산 앞 구왕봉으로 곧장 올라 갈 수도 있겠지만,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니 악희봉을 들러 한 참을 돌아가야 한다. 대간길에서 약간 벗어난 악희봉(832m)까지는 약7km, 넉넉잡아 3시간 거리, 악희봉에 올라 멀리 괴산 땅과 산들을 조망해보았다.
장성봉이 빗어낸 쌍곡구곡과 칠보산(779m), 작은 군자산(827m), 큰 군자산(948m), 덕가산(854m), 도명산, 가령산등 산 높이로 보면 비슷한 산들이 사이좋게 모여살고 있는 곳이 화양동 계곡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필자는 이 근처 산들과 정이 든 산들이 많다.
한창 때 산에 미쳤다(?)소릴 듣던 시절이었던가. 바쁜 직장생활로 틈을 내기 힘들 때였다. 고향을 다녀 오기위해 이곳을 지날 때 마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을 하나씩 오른 후 고향 집을 가곤했다.
이곳 속리산 뒤쪽 화양동 계곡 근처엔 이렇게 고만고만한 산들이 30여개나 널려 있어,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등산을 즐기기엔 참 좋은 곳이다.
지도상으로 버리미기재에서 다음 구간 이화령까진 약28km, 당일 산행거리로는 다소 먼 거리인지라, 종주꾼들은 통상 은티마을을 중간 쉼터로 정하고 산행계획을 세우곤 한다. 우리도 오늘 구간 목적지는 은티마을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까운 괴산까지는 20여km, 지근(至近)거리다.
늘 동네 어귀에 서서 제 잘난 ‘티’를 낸다하여 붙여진 ‘느티나무’는 양기(陽氣)가 성한 나무로 알려져 있어, 풍수지리상 음기(陰氣)가 센 괴산 땅에 심겨졌으니, 괴산의 괴(槐)자는 느티나무에서 얻은 지명이고, 그런 이유로 느티나무의 또 다른 이름은 괴목(槐木)이다.
그리고 괴산은 암울했던 일제치하 시절,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과 함께 조선의 3대 천재로 알려진 벽초 홍명회 고향이다.
임꺽정(林巨正)으로 더 유명했던 홍명회는 6. 25때 월북하여 부수상까지 지냈으며, 아들 홍기문은 북한에서 조선왕조실록을 번역한 국어학자요, 손자 홍석중은 근래 ‘황진이’라는 소설로 북한 출신 작가로는 최초로 만해문학상(萬海文學賞)을 수상한 문장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천하의적(天下義賊) 임꺽정은 세월 탓인지, 지금은 괴산 청결 고추장수로 전락하여 국도변 광고판 모델로 서있고... 한 때 낙양의 지가(紙價)를 올렸던 대문장가 홍명회 이름은 괴산 땅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최근 복원중인 생가에도 선친인 항일순국열사(抗日殉國烈士) 일완(一玩) ‘홍범식(洪範植)의 고가‘ 명패만 있을 뿐, 미완의 천재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다. 선친 일완(一玩)은 금산군수로 계시다, 경술국치 소식을 듣고 자결 하신 분이다.
‘기울어진 국운을 바로 잡기에는 내 힘이 무력하기 그지없고 ... 피치 못해 가는 길이니... 내 죽을지언정 친일하지 말고, 빼앗긴 나라를 기어이 되찾아야 한다.’
선친의 뜻을 받들어 항일운동에 투신, 수차례 옥고를 치루기도 했던 홍명회는 농지 17만평을 모두 소작인들에게 무상으로 넘겨주고, 월북하게 된 단초가 되었을지도 모를 선친의 유서였다.
악희봉에서 은치재까지는 넉넉하게 잡아도 2시간 거리이다.
신라 헌강왕 때 지증대사가 봉암사를 창건하기 위해 희양산(998m)아래 큰 연못을 파헤칠 때 나타난 용 아홉 마리를 구룡봉으로 쫒아 버렸다는, 봉암사 창건설화가 있는 구룡봉(877m)까지는 마당바위를 지나면서부터 가파른 오르막이다. 입에선 쇳소리가 났고 땀이 비오듯 떨어진다.
더위가 한 풀 꺾였다고는 하나 가을을 시샘하는 노염(老炎)인가, 아직도 남아있는 잔서(殘暑)인가, 금새 옷이 물에 빠진 듯 흠씬 젖는다. ‘입에 거품을 물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맞다, 더위는 늙지 않는다.
눈치 빠른 다람쥐가 화들짝 놀라 달아나는 구왕봉(877m) 정상에 올라서니 희양산이 한 눈으로 들어온다. 거대한 흰 바위 덩어리 하나가 희양산이다.
봉암사 입구에서 바라보면 상서로운 기운이랄까, 말로 설명할 수없는 영험함이 느껴지는 신비로운 모습이다.
조금 전 도망갔던 다람쥐가 바위틈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 아마 등산객이 버린 부스러기에 입맛이 들었는지 주위를 맴돌며 들락거린다.
지구상에서 열대우림은 지구의 허파에 해당한다. 환경오염으로 망가지고 있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산림자원이다. 최근 들어 그 열대우림에 비상이 걸렸다는 외신 보도를 본 적이 있다.
다름 아닌 박쥐의 개체수가 줄어들어 열대우림의 생장과 보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벌이나 나비, 새들은 밤중에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박쥐는 밤중에도 꽃가루받이는 물론, 따먹은 씨앗을 밀림 구석구석 배설해놓으니, 열대우림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지구환경을 살리는 일등공신은 열대지방의 눈 먼 박쥐들인 셈이다. 특히 박쥐는 국제환경단체인 ‘어스워치(Earth watch)’가 선정한 대체 불가능한 생물5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종(種)이다.
그리고 이곳 다람쥐나 어치도 자기가 숨겨놓은 열매 중 3할 정도는 장소를 기억하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끝내 찾지 못한 열매가 뿌리를 내려 숲을 이루었으니, 결국 어치나 다람쥐가 씨앗을 심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들의 기억력이 좀 더 뛰어났다면 지구는 이미 사막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알고 보면 하찮게 생각한 것 미물들이 숲의 생명줄이 된 셈이다.
땅콩을 던져주었으나 앞발로 볼을 부비며 눈치만 본다. 생사가 걸렸으니...먹고 사는 일 하나만 놓고 보면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햇살처럼 빛나고(曦), 밝다(陽)는 희양산(曦陽山)은 지명그대로 산전체가 거대한 흰 바위산이다. 진안 마이산과 북한산 인수봉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바위산으로 신비로운 모습이 마치 백두대간 정수리에 박혀있는 ’사리(舍利)‘와 같다 했고, 혹자는 백두대간의 ’단전(丹田)’에 해당하는 산이라 했다.
그리고 봉암용곡(鳳巖龍谷) 아래 둥지를 튼 봉암사는 좀처럼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 거대한 화강암 바위산인 희양산(998m)아래, 보석처럼 박혀있는 느낌이 드는 절이다. 겉모습은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한국 현대불교의 ‘탯자리’로 알려진 봉암사는, 지금도 큰 스님들이 ‘월봉토굴’이나 ‘용추토굴‘에선 목숨을 건 수행으로 깨어있는 불교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절이다.
지름티재에서 잠시 망중한을 즐기다
벌써 20여 년 전 일이 되었는가, 홀로 희양산을 찾았었다.
석가탄신일 외엔 봉암사 출입이 불가하다는 소문을 듣고, 뒷길인 은티마을로 올랐다. 설마하고 지름티재에 올라서니 과연 눈빛 푸른 젊은 스님한분이 빗자루를 들고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어딜 가시는 지요-’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내게 작지만 완강한 목소리로 이곳은 불교성지로 오를 수 없음을 말하곤, 굳이 쓸어 낼 것도 없는 산길을 휘익 휙 - 빗질해대는 것으로 답변을 피했던 젊은 스님 모습이 떠올랐다.
희양산은 그런 곳이다. 구도 행각을 떠난 스님들에겐 성지와도 같은 산이다. 더구나 정상 접근은 누구도 허용되지 않는, 마치 솟대와도 같은 신령스런 영역이다.
이곳 스님들은 적어도 희양산 만큼은 이렇게 세상 밖에서 고고한 자태로 남아있길 원하는 바램이 순백의 바위로 형상화된 탈속(脫俗)의 산이다. 구도자보다 산이 먼저 해탈된 모습, 그대로 있길 바라는 산이 희양산이다.
스님들도 그런 희양산을 닮길 원했는가.
출가한 스님이 길목을 굳게 지키고 있음에도, 종주꾼들은 하나같이 그 산을 오르길 간절히 염원한다. 오죽하면 숨어서 목숨이라도 걸고 오르고 싶어 하는 산이다. 숨어있는 절, 희양사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은티마을 초입 느티나무 아래 있는 가게는 대간꾼들사이 잘 알려진 쉼터다. 버리미기재에서 이화령까지 구간거리가 약 28km, 당일 거리로는 다소 먼 관계로 오가며 들르는 대간꾼들이 간단한 식사와 하룻밤을 머물며 막걸리도 한잔 할 수 있는 곳이다.
점방으로 들어서면 한쪽 벽면 가득 대한민국 산악회 이름으로 제작된 오색 시그널들이 빼곡히 붙어있다. 그을음이 잔뜩 낀 어두운 벽면 끝으로, 그리 어렵지도 어색하지도 않은 낙서가 삐뚤삐뚤, 금방이라도 우수수 떨어져 내릴 듯 적혀 있는데...
‘산이 좋아 산을 찾아 왔건만
종숙이는 날 산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나
맨 날 술만 마시라 하네-.’
아마 부엌에서 기름에 찌든 앞치마를 두르고 빈대떡을 붙이고 있는 사십대 후반 쯤 되어 보이는 시골아줌마 성함이 ‘종숙’인 듯싶다.
공연히 장난기가 발동해서 물어 보고 싶었지만... 그냥 일어서고 말았다.
( 06. 9. 16 )

저작권자 ⓒ 뉴스울산(nunnews.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강민수
강민수